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권력이 얼마나 냉혹한지 목격할 때가 있다. 나쁜 짓을 하면 경찰에 체포되고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다음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현대와는 달리 임금 같은 최고 권력자가 마음 속에 이미 판결을 내린 상태에서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하는 대로 자백하지 않으면 고문까지 더해진다. 법과 정의는 오직 권력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도 꼬투리가 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고문을 당하고 억지로 자백한 후에 처형을 당하는 사례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청나게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억울한 사람을 꼽으라면 오늘 소개할 강상인이라는 인물이다. 그는 태종이 즉위하기 이전부터 측근으로 활동했다. 태종이 뭔가를 맡기거나 조사할 때 언급되었으며, 착착 승진해서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를 하고 물러날 즈음에는 지금의 국방부 차관에 해당되는 병조참판의 자리에 올랐다. 양위를 하긴 했지만 군사에 관한 것은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으니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강상인을 병조참판의 자리에 앉은 것이고 모두들 그렇게 이해했다. 이 때 태종은 조말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화 전쟁박물관에서 찍은 병부 사진 ⓒ직접 촬영
강화 전쟁박물관에서 찍은 병부 사진 ⓒ직접 촬영
“우리 같은 노인들은 나가는 것이 가(可)하다.”
관료로서 촉이 좋았던 조말생이지만 이 말은 진심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태종은 잔혹하고 끔찍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세종이 아버지로부터 양위를 받아 즉위한 서기 1418년 8월, 드디어 태종이 그린 그림이 완성된다. 시작은 상아패와 오매패였다. 상아패는 글자 그대로 코끼리 뿔인 상아로 만든 패고, 오매패는 검은 매화나무로 만든 패로 임금이 고위 대신이나 장수들을 부르거나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한다. 사극에서는 전령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왕명이라고 외치면 별다른 의심 없이 시행하지만 실제로는 전령이 가져온 패를 항상 맞춰본다. 상아패와 오매패는 일종의 비상호출 장치 같은 것이었는데 당연히 군권을 장악한 상왕 태종이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병조판서 강상인은 태종 대신 세종에게 상아패와 오매패를 더 만들자고 보고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소식이 태종의 귀에 들어간다. 어쩌면 당일 날 들어갔을 수 도 있었다. 그 이전부터 강상인은 태종을 건너뛰고 세종에게 병조에 관련된 보고를 했다. 세종은 태종에게 먼저 보고하라고 지시했지만 철두철미한 태종이 그걸 모를 리 없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강상인에게 오매패와 상아패를 어디다 쓸 것이냐고 물었다. 강상인이 대신들을 부를 때 쓰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그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세종에게 갔다주라며 가지고 있던 상아패와 오매패를 건넨다.
함정에 걸린 강상인은 그걸 가지고 세종에게 가지고 갔다. 세종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고 묻자 강상인은 이번에는 장수를 부를 때 쓰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두 사람에게 각기 다른 대답을 한 것이다. 의도가 무엇이든 태종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다. 애초부터 계획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할 기회만 노린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강상인은 자신이 오랫동안 모시고 있던 태종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임금은 고문을 해서라도 무슨 이유로 거짓말을 했는지 자백을 받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새로 임금이 된 세종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강상인으로서는 배신감과 함께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 강상인에게 고문을 하되 죽지 않을 정도까지 하라는 지시를 내린 태종은 며칠 후에 오랫동안 자신을 따른 공로를 생각해서 용서해주겠다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내렸다. 감옥에서 풀려난 강상인은 이제 살았다며 한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태종의 속마음을 눈치챈 신하들은 강상인을 처벌하라고 상소문을 올렸다. 처음에는 거부하고 관노로 삼는 조치를 취했던 태종은 그해 11월쯤 마음을 바꿔서 강상인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그리고 무슨 수단을 써서 조사할지도 딱 집어서 얘기한다. 바로 압슬형이다.
사극에서는 보통 주리를 틀거나 불에 달군 인두를 지지는 고문을 보여주지만 가장 끔찍한 고문은 압슬형이다.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들을 뿌리고 그 위에 죄인을 무릎 꿇게 한 뒤에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거나 사람이 올라가는 방식이다. 한 마디로 죄인의 정강이와 무릎을 아작내는 것인데 강상인은 무려 다섯 번이나 압슬형을 당했지만 원하는 자백을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믿고 따른 태종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에 분노한 것이다. 하지만 매에는 장사가 없는 법. 결국 강상인은 혹독한 고문으로 너덜너덜해진 몸이 된 채 자백을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조정 대신들과 장수들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태종은 이런 자백들을 손에 쥔 채 누가 조선의 진정한 임금인지를 신하들에게 똑똑히 각인시켜주었다. 11월 26일, 옥사가 벌어진 지 불과 석달만에 태종의 측근에서 역적이 된 강상인은 사지가 찢어버리는 거열형에 처해졌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실록에 남아있다. 아마도 그의 억울함을 알고 있던 사관이 훗날의 나 같은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 같다.
상인이 수레에 올라 크게 부르짖기를, “나는 실상 죄가 없는데, 때리는 매를 견디지 못하여 죽는다.” 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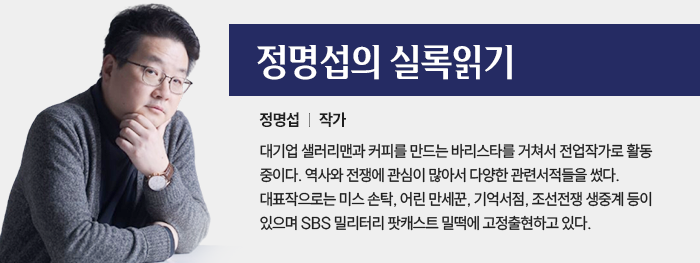 ⓒ
ⓒ
정명섭 작가
0
0
기사 공유
댓글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실시간 랭킹뉴스
실시간 랭킹뉴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