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이 탄생하고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새로운 재난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바로 화재였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돌던 원시시대에는 화재가 생길 일이 없었다. 오히려 모닥불의 불씨를 꺼트리는 일이 더 큰 재난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얘기 달라졌다. 수 많은 집들이 다닥다닥 모였고, 그 집들은 불에 잘 타는 나무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도시들은 화재에 취약했다. 네로 황제 시절 로마를 불태운 대화재가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도 이런 큰 화재를 겪은 적이 있다. 세종대왕이 즉위한 지 8년째인 서기 1426년 2월 15일에 벌어진 일이다.
 소방 역사박물관에 전시 중인 멸화군 모형과 드므 사진 ⓒ본인제공
소방 역사박물관에 전시 중인 멸화군 모형과 드므 사진 ⓒ본인제공
점심때에 서북풍이 크게 불어, 한성부의 남쪽에 사는 인순부의 종 장룡의 집에서 먼저 불이 일어나 경시서 및 북쪽의 행랑 1백 16간과 중부의 인가 1천 6백 30호와 남부의 3백 50호와 동부의 1백 90호가 연소 되었고, 인명의 피해는 남자 9명, 여자가 23명인데, 어린아이와 늙고 병든 사람으로서, 타죽어 재로 화해버린 사람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마도 불씨가 바람에 날리면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날아간 불씨는 초가집 지붕에 떨어지면서 점점 더 커졌을 것이고, 서북풍을 타고 북쪽으로 번졌다. 지금의 종로에 해당되는 중부는 운종가라고 불리는 시장이 있었는데 민가보다 건물이 더 다닥다닥 붙어 있고, 판매하기 위해 쌓아둔 상품 중에는 불에 잘 타는 천들이 있었다. 운종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불은 한양 전체로 번져서 약 2200채의 집과 116칸의 행랑을 태워버렸다. 인명 피해는 23명으로 집계되었지만 불에 타서 재가 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으니 아마도 더 많았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 한양의 인구조사 현황을 보면 집이 2만여 채가 넘지 않았다. 따라서 하루 동안의 화재로 한양 전체 가옥의 10분의 1 넘게 피해를 입은 것이다. 화마는 경복궁까지 미쳤는데 하필이면 세종대왕과 세자는 군사훈련과 사냥을 겸한 강무를 하러 한양을 비운 상태였다. 만삭의 몸인 소헌왕후는 보고하러 온 황희에게 종묘와 창덕궁은 꼭 지키라고 당부한다. 다행히, 종묘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화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종루 근처에서 다시 불이 나면서 200여 채의 집과 8칸의 행랑이 불에 타버렸다. 다행히,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불을 끄면서 종루는 보존되었다.
보고를 받은 세종대왕은 강무를 취소하고 한양으로 돌아온다. 이때 세종대왕은 드물게 신하들에게 짜증을 낸다, 요약하자면 자기는 한양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어제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돌아가고 싶었지만 신하들이 말려서 어쩔 수 없이 남았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고 얘기한 것이다. 물론 세종대왕이 한양에 남았다고 일어날 화재가 안 일어나거나 피해가 줄지는 않았겠지만 속상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 화재가 발생한 지 나흘만인 19일에 도성에 돌아온 세종대왕은 불에 탄 한양을 보고 망연자실했을 것이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돌봐주고, 불탄 집들을 다시 지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은 화재가 난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그 와중에 도둑질을 한 범죄자를 체포하고, 집과 재산을 잃은 백성들을 위해 곡식과 장을 나눠주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 만큼이나 다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했다. 세종대왕은 집들이 너무 붙어있고,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가 큰 운종가의 행랑들은 사이에 방화벽을 쌓고, 불을 끌 수 있는 우물들을 곳곳에 만들도록 지시했다. 여기까지 했다면 세종대왕이 아니었다. 아무리 조심해도 화재가 계속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세종대왕은 화재를 진압할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한다. 지금으로 치면 소방대를 편성한 것인데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상설 소방대일지 모르겠다. 화재가 발생한지 열흘만인 2월 26일 이조에서 금화 도감의 설치를 건의한다. 불을 막는 관청이라는 뜻의 금화도감은 다시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고 싶어했던 세종대왕의 염원이 담겼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화도감은 도성의 화재를 막고 감시하는 일을 했다. 특히,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건조한 날에는 순찰을 돌면서 불이 나는 걸 감시했는데 화재가 밤에 일어날 경우 통금에 걸리지 않도록 야행물금첩도 소지했다. 물론 지금처럼 소방차나 호스로 화재를 진압하지는 못했지만 물에 적신 천으로 불을 끄고, 심한 화재가 난 집은 기둥에 밧줄을 걸어서 넘어뜨려서 더 번지는 걸 막았다. 그리고 경회루를 비롯한 궁궐 전각의 지붕에도 쇠사슬을 두르게 했다. 지붕에 불이 났을 때 쇠사슬을 잡고 끄도록 한 조치였다. 이런 노력 덕분에 한양은 몇 차례 화재가 더 일어났지만 1426년 2월만큼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사람이나 조직은 늘 실패를 겪는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대왕은 실패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고, 오늘날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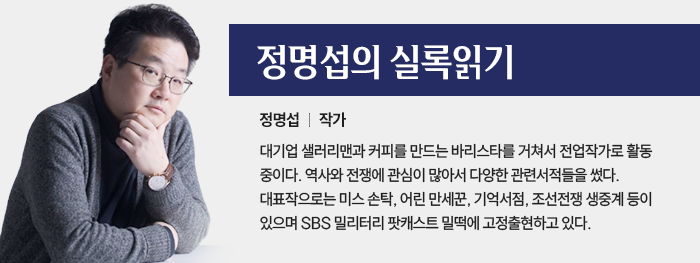 ⓒ
ⓒ
정명섭 작가
0
0
기사 공유
댓글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실시간 랭킹뉴스
실시간 랭킹뉴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