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전쟁을 냄새로 표현할 때 피비린내 혹은 매캐한 화약 냄새를 얘기한다. 실제로 피와 화약 냄새를 맡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깨닫는다. 화약은 인간의 힘을 쓰지 않고 화살이나 돌, 혹은 폭탄을 멀리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물론, 잘 훈련된 궁수가 쏘는 화살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훈련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화약을 이용하면 잠깐만 훈련시키면 발사할 수 있었다. 정확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전쟁터에서는 목표물인 적들이 많았으니까 말이다.
 행주산성에 전시된 화차 (본인 촬영)
행주산성에 전시된 화차 (본인 촬영)
고려 때 최무선이 만든 화약을 이용해서 왜구를 격퇴했고, 조선 역시 그걸 이어받아서 아주 잘 써먹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지금도 종종 농담삼아 우리를 ‘화력의 민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화약을 사랑한 임금이 있었다. 바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이다. 훈민정음의 창제에 가려져서 그렇지 세종대왕은 4군 6진을 설치하고 파저강의 야인을 정벌하기도 하는 등, 영토 확장에도 힘을 기울였다. 세종대왕이 설치한 4군 6진과 국경선은 거의 그대로 중국과 우리의 구분점이 되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야인이라고 불렸던 여진족과의 피비린내는 싸움이 불가피했다.
우리는 진출 혹은 확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당하는 여진족 입장에서는 침략으로 봐도 무방했다. 특히, 여진족들은 만 명이 모이면 천하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용맹한 부족이었다. 순순히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진족들은 무리를 지어서 조선이 설치한 목책과 소규묘 요새들을 공격하고, 백성들을 붙잡아가고 약탈을 저질렀다. 당연히, 조선은 이에 맞서 군대를 파견해서 요새를 만들었다. 고려의 주적이 왜구였다면 조선의 주적은 초기에는 당연히 여진족이었다. 말을 타고 바람처럼 나타나서 공격하고 사라지는 여진족의 속도를 따라잡기는 힘들었다. 여기에 맞선 조선의 대책은 바로 화약 무기였다.
세종대왕 시기 여러 종류의 총통들이 개발되어서 배치되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기전이라고 불리는 무기였다. 개념은 아주 간단했다. 화살에 화약통을 달아서 쏘는 방식이었다. 활시위에 끼워서 발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비싸과 관리하기 힘든 활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었다. 문제는 주화를 한 발 정도 쏘는 걸로는 상대방을 맞출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이럴 때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대책은 바로 여러 발의 주화를 한 번에 발사한다는 것이었다.
세종대왕은 주화의 이름을 신기전으로 바꾸는 것 까지 했다. 그 다음은 아들인 문종의 몫이었다. 아버지에게 가려지긴 했지만 문종 역시 능력자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기전을 발사할 수레 겸 발사 장치라고 할 수 있는 화차를 개발했다는 점이다. 보통 임금은 지시를 내리는 쪽에 가깝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직접 만든 것처럼 아들인 문종은 신기전을 대량으로 발사할 화차를 직접 개발하고 운용법까지 정리했다.
군기감에 명하여 화포를 쏘게 하고 허수아비를 만들어 갑옷을 입히고 방패를 가지게 하여 그것을 7, 80보 밖에 세워 두고, 화차(火車)의 화살을 쏘아서 추인과 방패를 모두 관통하였다.
문종 1년인 서기 1451년 1월 16일 자 실록에 나온 기록이다.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방패와 갑옷을 들고 서 있는 허수아비를 모두 관통하는 무시무시한 성능을 보여줬다. 사극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화살은 갑옷을 뚫고 박히지만 쇠나 가죽으로 만든 갑옷은 화살을 충분히 막아낸다. 심지어 종이로 만든 갑옷조차 화살에 관통되지 않았다. 하지만 화약의 추진력을 이용한 신기전은 방패와 갑옷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상대적으로 갑옷과 투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여진족에게는 특히,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문종 화차라고 불린 이 화차는 두 개의 바퀴가 달린 수레 위에 수십 개의 신기전을 쏠 수 있는 발사대를 끼우는 형식이다. 그리고 심지에 불을 붙이면 수십 개의 신기전이 발사대를 박차고 날아오른다. 명중률은 둘째치고 불꽃을 머금으면서 날아가는 모습은 화려하고 박력이 넘친다. 보는 쪽에서는 멋지다고 표현하겠지만 당하는 쪽에서는 날벼락이나 다름없었다. 특히, 말을 타고 치고 빠지는 전술을 쓰는 여진족에게는 아무리 빨리 도망쳐도 소용없는 공포스러운 무기였을 것이다.
문종이 개발한 화차는 수백 대가 만들어져서 최전선인 4군 6진을 비롯한 국경선에 배치되어서 여진족을 막는데 큰 효과를 봤다. 그뿐만 아니라 세조 때 일어난 이시애의 난을 토벌할 때에도 유용하게 써먹는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은 보험 같은 존재다. 평상시에는 돈 먹는 하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나라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니까 말이다. 조선에게 화약은 그런 존재였다. 그리고 세종과 아들 문종이 대를 이어서 화약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했다는 점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 화약을 사랑했다고 얘기해도 어색하지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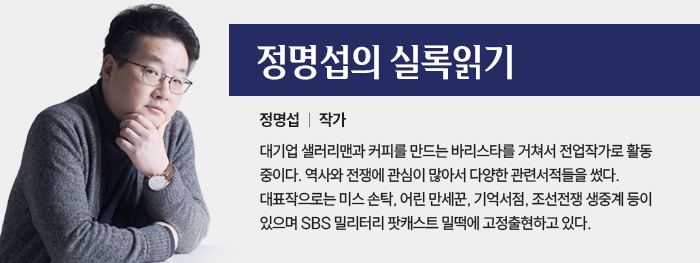 ⓒ
ⓒ
정명섭 작가
0
0
기사 공유
댓글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실시간 랭킹뉴스
실시간 랭킹뉴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