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올해 73주기 맞이하는 6·25전쟁
학교에서 6·25전쟁 계기교육 잘 되고 있나
전교조 홈페이지 6·25전쟁 자료없어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DB
2013년 전국 고교생 5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역사인식 조사에서 10명 가운데 7명이 6·25전쟁을 ‘북침’으로 알고 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다. 물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해 혼동했을 수도 있지만 그 조차도 학교에서 6·25전쟁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지난해 문재인 정권에서 설계한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남침’이라는 말이 빠지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말이 빠졌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다행히 많은 국민의 항의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수정·보완요청에 따라 2022개정교육과정 최종안이 통과되었지만 늘 편향성 논란이 큰 교과서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의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교과서조차 상황이 이러한데 교사의 재량에 맡기는 계기 교육 상황은 어떨지 짐작이 간다.
우리 사회에서 유난히 비판을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직후 2014년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260개의 수업 자료가 올라와 있다. 그리고 계기 교육 게시판에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관련 계기 수업자료 외에 5·18민주화운동 계기 교육 수업자료, 4·19혁명과 민주운동 계기 수업 제안, 4·3제주항쟁 평화인권주간, 세계노동절, 환경의 날, 생물 다양성의 날 등 많은 수업자료가 올라와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그 어디에서도 6·25전쟁이나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과 관련된 계기 수업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업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리 학생들의 역사의식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6·25전쟁 관련 교육이 학교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6월 17일,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6·25전쟁을 통해 본 자유의 가치’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있었다. 이 세미나를 주최한 대한민국교원조합(조윤희 상임위원장) 교사들은 학교에서 6·25를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북한의 남침으로 벌어진 6·25전쟁이 왜 점점 잊히고 있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만한 시간이었다.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곳곳에 세워져 있는 유엔참전국의 참전 기념비와 추모공원 모습을 담은 윤상구 작가의 영상을 볼 수 있었다. 참전국들의 국가(國歌)가 흘러나오는 영상을 보는 내내 깊은 울림으로 못내 엄숙해졌다. 그 울림은 6·25전쟁을 통해 깨닫게 된 자유의 가치,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유엔 참전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유엔사친선협회(KUFA)의 자문위원인 황인희 작가 또한 유엔참전국의 참전 기념비를 잘 가꾸고 감사함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국격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밭 한 가운데 또는 큰 도로가에 덩그러니 있는 참전 기념비나 누구나 쉽게 갈 수 없는 곳에 초라하게 그 흔적만 남아 있는 유엔군 화장장 모습은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참전국을 기억하고 참전 기념비를 잘 가꾸는 것은 73년 전 이념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각 나라의 젊은 용사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것이다. ‘도리를 알아야 한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위키백과에도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침공(남침)하여 발발한 전쟁이다.” 라고 쓰여 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6·25전쟁의 원인을 명확히 가르치는 교육, 그런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지금처럼 양쪽으로 쪼개진 국민이 통합될 수 있다.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은 값진 것이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의 빚을 지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이 자유를 지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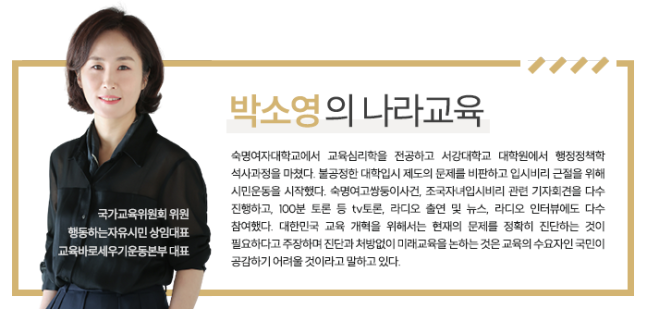 ⓒ
ⓒ
글/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2
0
기사 공유
댓글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실시간 랭킹뉴스
실시간 랭킹뉴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