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인 인디아’로 반도체 산업 속도
9600억 루피 투입…정부 보조·글로벌 합작 투자 확대
KIEP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기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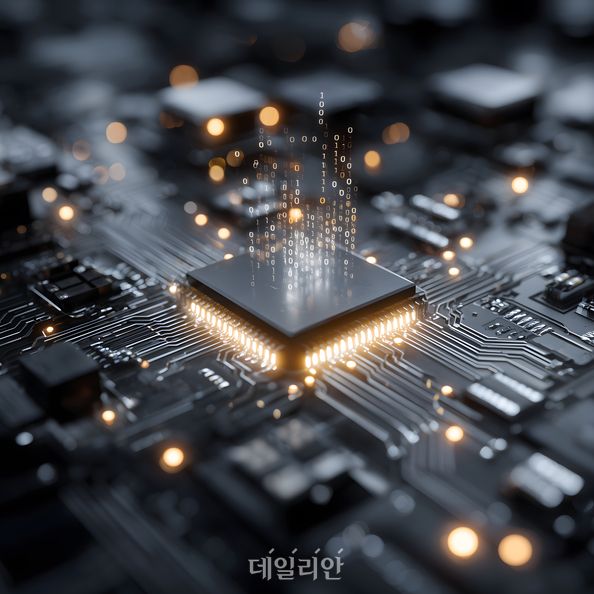 인도의 반도체 투자와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아직 여러가지 한계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인도의 성장은 분명 주목 받는 분위기다. ⓒ게티이미지뱅크
인도의 반도체 투자와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아직 여러가지 한계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인도의 성장은 분명 주목 받는 분위기다. ⓒ게티이미지뱅크
인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글로벌 기업의 연이은 투자로 인도 반도체 산업이 혁신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생산·설계·패키징 등 모든 영역에서 대규모 자본 투입과 민관 협업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연구개발(R&D)와 스타트업 생태계 또한 빠르게 팽창 중이다. 그러나 글로벌 선두권 도약에는 여전히 기술력·공급망·인력 등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다. 인도 반도체가 ‘양적 확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주도 장벽 허무는 정책, 성과 가시화
인도가 ‘제2의 실리콘밸리’로 도약하기 위해 전방위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21년 생산연계인센티브(PLI), 디자인연계인센티브(DLI) 등 다층적 정책을 본격화했다. 2023년 ‘인도 반도체 미션(ISM)’을 공식 출범해 제조·설계·패키징 등 밸류체인 구축에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정부는 조립·테스트·패키징(ATMP)와 외주 조립·테스트(OSAT) 부문에 캡엑스(CAPEX) 기준 최대 50% 보조를 제공하며 마이크론, 레네사스, CG Power, 타타 등 글로벌 선두업체의 생산기지 유치에 성공했다.
올해 8월 기준 ATMP·OSAT 프로젝트에 투입된 총액은 9600억 루피(약 15억 달러)에 달한다. 타타-PSMC JV 공장은 9100억 루피 단일 투자와 약 5800명 직접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별로는 Micron이 2252억 루피, CG Power가 760억 루피, Renesas와 STARS가 합작한 타타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Tata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가 2700억 루피, Kaynes가 330억7000만 루피, 3D Glass Solutions가 194억3000만 루피를 각각 집행해 현지 생산역량을 크게 끌어올렸다.
이밖에 인도 정부는 정부·기업(G2G), 기업·기업(B2B) 간 전략적 협업으로 효율을 높이고, 글로벌 소싱·공급망 연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디자인 앤 메이크 인 인디아(Design and Make in India) 등 캠페인을 내세워 ‘국내 설계→국내 생산→국내 공급’ 선순환 고리를 구축 중이다.
강반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은 “정부 주도의 투자 집중으로 생산·설계·인력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지난해 이후 정책-경제-기술 혼합 패키지 전략을 통해 해외 주요 기업과의 R&D·생산 연계도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설계 제조 공정별 주요 국가 및 기업(202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반도체 설계 제조 공정별 주요 국가 및 기업(202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R&D·스타트업 동력…“디자인·AI 강국” 청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인도 반도체 추진 성과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PLI, DLI 제도 아래 올해 8월 기준 38개 설계혁신 프로젝트를 선정, CCTV·IoT·AI 기반 100여 개 스타트업에 재정과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설계 대기업인 IBM, 삼성, 레네사스, 마인드그로브 등의 인도 내 신설 R&D 센터 역시 인도 반도체 설계·연구 집적도를 높이고 있다.
2024~2025년에는 대형 외국계와 현지 기업 간 AI, 반도체 R&D 협력이 급증했다. 협력 건수는 1600건에 육박한다. AMD는 2023년 인도에 최대 글로벌 디자인센터를 구축했고, Qualcomm은 2024년 첸나이에 신규 디자인센터를 개소하며 차량용 모듈 현지화와 매출 2배 증대 목표도 내놨다.
삼성은 올해 벵갈루루에 R&D 시설을 새로 열고, 반도체·AI 미래기술 분야 인재 2만명 양성 계획도 밝혔다. 특히 르네사스(Renesas)는 인도의 첫 3나노 칩 설계를 추진 중이다. LT Semiconductor와 IBM 간 첨단 프로세서 디자인 공동개발도 궤도에 올랐다.
인도 전자제품 수출 역시 급성장 추세다. 2023~2024회계연도 기준 52억 달러, 2021년 대비 19.8% 신장됐다. 정부는 2030년 1030억 달러까지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 연구원은 “인도의 강점은 양질의 인적자원과 설계 경쟁력에 있다”며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포함되면 파운드리와 소재·부품·장비까지 확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세계와의 격차 및 한계…“파운드리·기술력 확보 관건”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인도 반도체 산업이지만, 아직 글로벌 주요국의 기술력·공급망 수준을 따라잡기엔 현실적 한계도 뚜렷하다.
칩 생산(파운드리) 부문은 숙련 인력 부족, 첨단 공정 기술력 미흡, 설비 효율성 등 복합적 과제가 남아 있다. 실제로 설계 및 조립 단계에선 이미 미국·한국·대만의 다국적기업 의존도가 높고, 핵심 장비와 원자재, 고성능 테스트 분야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편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민간 R&D 확대, 원자재·부품 국산화, 인재 양성 등 산업 기반 세부 설계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올해 열린 세미콘 인디아(SEMICON India) 행사에선 “데이터가 말해주는 우리 산업의 성장 신호는 분명하나, 실제 글로벌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시장 참여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인도는 선진 시장 편입과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강화라는 대전환기에 서 있다. 목표한 자립화까지는 과제가 남았으나, 데이터가 보여주는 인도의 반도체 드라이브는 동남아·글로벌 시장 지도를 새롭게 그릴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강 연구원은 “인도 반도체 산업이 단기에 급성장했으나, 첨단 공정·고도 테스트·생산 설비 효율성 등 글로벌 상위권 기업과는 아직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는 선진시장 편입과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강화라는 대전환기에 서 있다”며 “단기적 성과 이상으로 중장기적 질적 성장관리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실시간 랭킹뉴스
실시간 랭킹뉴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