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독점 지위 사라져 국민·기업은행 등 자체인증서 도입
은행 "현재 온라인 금융거래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 효력은 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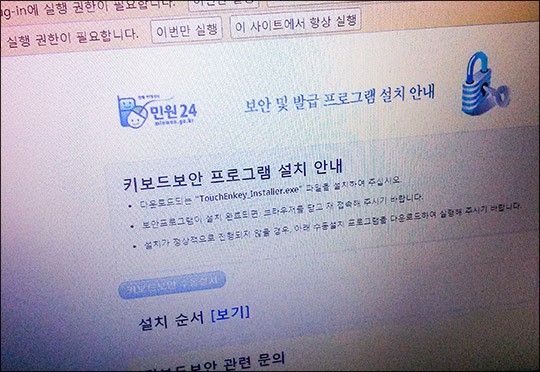 온라인 인감증명서로 불리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게 됐다.(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안
온라인 인감증명서로 불리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게 됐다.(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안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는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장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깔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기술(IT) 분야 '적폐'로 통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없어짐에 따라 편리한 사설인증 방식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이 사라지고,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이 기존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는 상대적으로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 인증서비스에 밀리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돼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일종의 '전자인감'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여년 간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 비롯해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이나 주택 청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됐고, 은행에서는 2003년부터 공인인증서가 본인 확인 수단으로서 의무화됐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프로그램 설치과정과 본인 인증 절차가 복잡해 사용하기 불편하고, 관련 플러그인 기술인 '액티브X'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시장 독점으로 서비스 혁신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유효기간이 1년으로 짧고, 만료 한 달 전에 갱신하지 않으면 재발급받아야 하는 등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이 컸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절대적으로 불리한 시스템이었다. 공인인증서의 '적폐' 요인 가운데 하나는 금융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이었다. 예컨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도용당하거나 해킹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계좌에 접근해도 금융사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날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당장 은행들이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변경하거나 금융소비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은 현재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써도 되고, 다른 인증서를 써도 된다"면서 "기존 인증서를 계속 사용하시겠다고 하지는 고객들에겐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11월부터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된다. 결국 공인인증서의 점진적 퇴장에 따라 금융권도 서서히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과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홍채, 지문인식 등 여러 형태의 인증방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은행권에선 은행들이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사설인증서인 '뱅크사인'을 이용한 신원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보안성과 간편한 로그인, 3년의 인증서 유효 기간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 번 발급으로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향후 사용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은행권은 기대하고 있다. 뱅크사인은 현재 가입자가 30만명 수준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인증 서비스를 개발해 온라인뱅킹에 활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인증서를 받는데 1분이면 가능한 'KB모바일인증서'를 내놨고, 기업은행은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뱅킹 앱인 'i-ONE(아이원)뱅크 2.0'을 출시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실시간 랭킹뉴스
실시간 랭킹뉴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