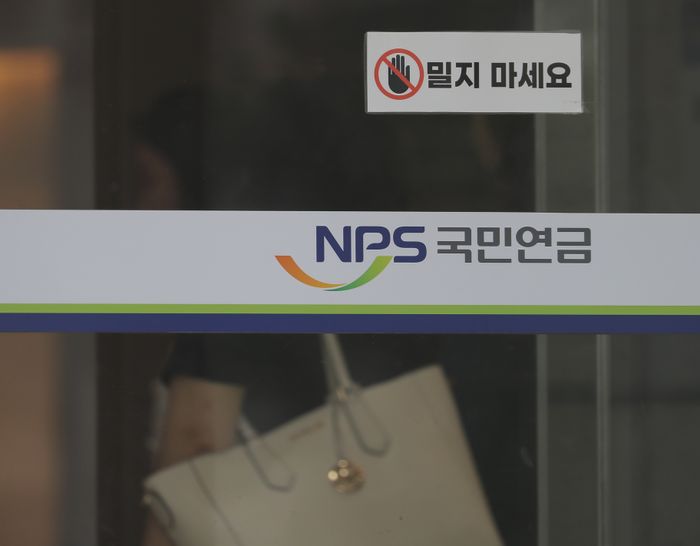 서울 시내 한 국민연금공단 사옥. ⓒ뉴시스
서울 시내 한 국민연금공단 사옥. ⓒ뉴시스
국민연금의 미래는 단순히 기금 운용 성과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제도 개혁과 보험료율 조정, 저출생·고령화 추세가 함께 맞물려 있다. 그중 1300조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의 무게가 국민 노후에 미칠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하지만 이를 굴리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들여다보면 의구심이 든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당연직으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경제·투자 전문가보다 관료가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구조다. 그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당연직 위원들의 배경도 경제학·경영학·행정학·의학 등 각 부처 정책과 관련된 전공이 대부분이다. 각자의 영역에서는 전문성이 있지만 자산운용·금융투자와는 거리가 있다. 결국 당연직은 투자 전문가라기보다 정책 조율자 성격에 가깝다.
위촉직 위원 역시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로 구성돼 이해관계 대변에 치우치기 쉽다. 경영계는 기업 부담, 노동계는 권리 보장, 지역대표는 몫 확보에 초점을 두는 구조다. 균형은 중요하지만 전문성은 뒷전으로 밀린다.
물론 이들이 위원에 들어가는 데 명분은 아예 없진 않다. 기금 운용이 단순한 투자 의사결정이 아니라 국가 재정, 노동시장, 산업 정책과 긴밀히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명분이 곧 전문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투자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을 읽고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이다. 기금위는 ‘대표성은 확보했지만 전문성은 비어 있다’는 모순에 갇혀 있다.
이 모순은 지금처럼 연금 개혁과 고갈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는 시기에 더욱 뚜렷해진다. 수익률이 조금만 흔들려도 고갈 시점이 수년 앞당겨질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여전히 관료의 당연직이나 이해관계자가 위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세계 주요 연기금을 보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앞세운 거버넌스 구조가 일반적이다. 캐나다연금(CPPIB), 일본 GPIF 모두 자산운용 전문가와 시장 경험자를 핵심에 두고 정부는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다.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과 급여 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금위의 체질 개선도 함께 가야 한다. 당연직과 이해집단 대표로 자리를 채우는 구조에서 벗어나 진짜 전문가의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 1300조원을 움직이는 기금위는 대표성보다 전문성이 먼저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숫자로만 환산되는 재정이 아니라 세대 간 연대를 떠받치는 사회적 기반이다. 기금운용의 전문성은 곧 그 기반을 지켜낼 마지막 방파제다. 그 방파제가 무너지면 국민의 노후와 제도의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0
0
기사 공유
댓글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실시간 랭킹뉴스
실시간 랭킹뉴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