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통 신용평가 한계 보완…대안신용평가 띄우기
미국·영국·일본, 대안신용평가 일부 도입…부작용에 신중론 제기
플랫폼·PG·공공데이터까지 원천 다양…정합성·오류 관리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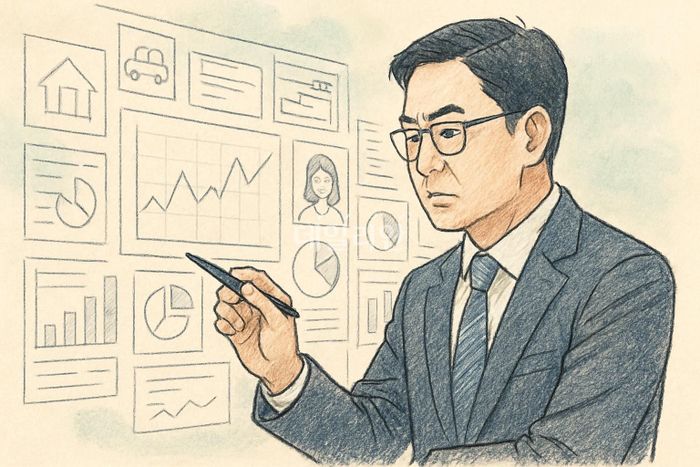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거래 이력 대신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대안신용평가(ACS)’가 떠오르고 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거래 이력 대신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대안신용평가(ACS)’가 떠오르고 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거래 이력 대신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대안신용평가(ACS)’가 떠오르고 있다.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오류 없이 신용평가 모형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적·제도적 기반 없이 서둘러 도입할 경우 ‘알고리즘 편향’에 의해 오히려 중저신용자들을 왜곡해 평가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 관련기사 보기
신용사면 이후 새 경쟁축, 인뱅 3사 ‘대안신용평가’ 고도화 경쟁
카카오뱅크, 자체 대안신용평가 모형으로 중·저신용자에 1조원 공급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보 공유에 제약이 있는 민간의 데이터보다는 우선 전기·수도요금 납부 내역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를 논의 중이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해 중저신용자 의무 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통적 신용평가사(CB) 중심 체계에서 사회초년생·주부·이주노동자·자영업 초기 등 금융정보가 부족한 씬파일러의 신용평가에 사각지대가 계속되자,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ACS가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핵심으로 부상한 것이다.
ACS의 도입을 위해선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함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또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핀테크융합전공 부교수는 “신용평가 영역에서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정제된 데이터가 거의 없다”며 “산업 내에서 AI 학습 재료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새로 생성하는 생성형 AI 기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 시스템이 발전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대안신용평가를 일부 도입해 포용금융을 늘리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알고리즘의 편향·차별, 데이터 품질 리스크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비금융 데이터를 금융평가에 이용하겠냐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출이 급한 중저신용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신용평가를 받기 위해 데이터 공개를 강요받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
미국에서는 머신러닝 기반 신용모델이 소득·인종·지역에따라 알고리즘 편향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 PG사, 플랫폼, 통신사 등 비금융 데이터의 원천이 다양해지면서 누락되거나 정보 공유 지연으로 평가 시 적용되지 않을 경우 신용결정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도 지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는 각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서 금융위는 대안평가모델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있던 신용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한 것이라 실제로 활용가치가 있는지는 시장에서 결국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안신용평가가 도입되더더라도 결국 직접 전문가가 데이터의 추이를 보며 조정하는 평가 과정이 필요하다”며 “포용적 차원에서 금융위가 평가모형 고도화를 제안할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일괄 도입을 하게 된다면 금융기관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실시간 랭킹뉴스
실시간 랭킹뉴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