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 1200년 된 사찰인 에이칸도 단풍은 압도적인 세계 제일
일본정원의 틀에다 단풍을 접목시켜 빼어난 인공미를 만든 장인정신
노벨상 수상자 많은 교토대의 장인정신을 연구할 필요성
 교토 루리코인(瑠璃光院)에서 마치 액자처럼 단풍을 찍을 수 있는 포토스팟. ⓒ KEIHAN
교토 루리코인(瑠璃光院)에서 마치 액자처럼 단풍을 찍을 수 있는 포토스팟. ⓒ KEIHAN
필자가 젊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단풍에 흠뻑 빠져들었다. 설악산 천불동계곡을 시작으로 국내 명소는 죄다 돌아다녔다. 내친김에 올해는 세계 제일이라는 일본 교토(京都)의 단풍이 궁금해 며칠 전 방문했다. 교토는 일본의 정신적 중심으로 천 년 동안(794~1869년) 수도이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봄의 벚꽃 구경을 하나미(花見)라고 부르고 가을철 단풍 시즌에는 모미지가리(紅葉狩り)라고 하여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산, 공원, 사찰 등을 찾아 단풍을 감상하는 전통 행사가 유명하다.
우리나라는 11월 하순에 단풍이 끝났지만, 교토의 11월 말과 12월 초는 절정인 단풍을 보려고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와 인산인해다. 최근 중국의 한일령(限日令)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웬걸. 곳곳마다 일본인, 서양인, 중국인, 한국인이 뒤죽박죽되어 사람에 치여 가며 구경했다.
교토 단풍을 직접 본 결론은 충격적이었다. 교토에는 우리나라 당단풍과 비슷한 이로하모미지 품종에다 귀여운 아기단풍이 압도적이라 안토시아닌 색소가 뱉어내는 붉은 기운이 몽환적이다. ‘일본의 경주 불국사’로 불리는 동쪽 기요미즈데라(淸水寺), G20 정상 부인들이 방문해 화제가 되었던 남쪽 도후쿠지(東福寺), 도게츠 다리와 대나무 숲으로 유명한 서쪽 아라시야마(嵐山)에는 지금도 단풍이 울긋불긋하다. 아라시야마는 헤이안 시대 귀족들이 별장을 짓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즐겼다. 사치스러우면서도 우아한 그들의 문화는 일본의 전통을 이루는 원류가 됐다.
하지만 교토 단풍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1200년 된 정토종 사찰인 에이칸도 젠린지(永觀堂 禪林寺)다. 3000그루의 단풍나무에서 뿜어내는 화사한 아름다움이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마치 ‘천불동계곡(설악산)+내장산+주왕산+창경궁+선운사+화담숲+아침고요수목원’의 엑기스를 한곳에 모아 고즈넉한 사찰에 이리저리 버무려 놓은 듯했다. 생애 최고의 운치 있는 단풍이었고, 전 세계에서 단풍이 한 곳에만 있다면 단연 여기를 꼽고 싶다.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교토 기요미즈데라의 야간 라이트업(Light-up) 행사. ⓒ 최홍섭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교토 기요미즈데라의 야간 라이트업(Light-up) 행사. ⓒ 최홍섭
사실 우리나라의 단풍이 순수한 자연 그 자체, 또는 자연과 건물의 부드러운 조화에 특징이 있다고 하면 일본은 다르다. 대체로 일본정원(Japanese Garden)이란 틀 안에다 단풍 세계를 옮겨 와 새로운 세상을 창조했다. 일본정원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손길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다. 화장 안 한 척 화장하는 데 공이 많이 들어가는 법이다. 미니멀리즘(minimalism)과 선(禪)의 철학을 따라 단순함과 절제를 중요시한다. 또 4계절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설계된다. 봄에 벚꽃, 여름에 녹음, 가을엔 단풍, 겨울은 눈이 덮인 풍경을 녹여낸다.
일본정원은 공간의 활용에 주목하고 실제보다 더욱 넓게 느껴지도록 방향이나 길의 너비를 갑작스레 바꾼다. 다리 같은 지형지물로 다양한 전망을 계속 연출한다. 먼 곳의 풍광을 간접적으로 이용해 정원을 웅장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실제 에이칸도 젠린지의 기다란 실내 복도를 따라 걸으니 이리 꺾이고 저리 올라가며 변화무쌍했다. 코너 코너마다 단풍이 수줍은 듯 반가운 듯 어우러지니 숨 막히는 절경이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지난해 펴낸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에서 “일본의 정원과 우리나라 정원은 너무도 다르다. 일본은 나무를 일일이 가위질하며 인공미를 극대화하고 한국은 자연미를 더 존중한다. 정원에 돌 10개를 깔아놓는다면 일본 정원사는 9개를 반듯이 놓고 나서 1개를 약간 비스듬히 틀어놓으려고 궁리하는데, 한국 정원사는 9개는 아무렇게 놓고 나서 1개를 반듯하게 놓으려고 애쓰더라는 것이다. 일본은 인공미, 한국은 자연미를 그렇게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유 관장은 “문화유산의 입장에서 내가 본 일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장인정신과 직업윤리 의식”이라고 결론지었다.
결국 교토 단풍을 보고 난 느낌은 일본이 자랑하는 장인정신(匠人精神)의 집약체라는 점이었다. 단풍이란 자연의 산물이 오랜 시간 장인의 손을 거치면서 마치 일본 제조업 전성기 시절의 명품처럼 변해 있었다. 교토 단풍은 자연을 앞세운 인공이었다.
 교토 에이칸도 젠린지의 화려한 단풍과 수많은 관광객들. ⓒ 최홍섭
교토 에이칸도 젠린지의 화려한 단풍과 수많은 관광객들. ⓒ 최홍섭
교토의 장인정신을 언급하니, 노벨상 수상자를 10명이나 배출한 교토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토대는 노벨상 수상자에서 일본 최고 명문인 도쿄대에 뒤지지 않는다.
2025년 노벨화학상은 새로운 분자 구조 ‘금속·유기 골격체’MOF)'를 개발한 세 과학자에게 돌아갔는데,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교수(74)가 공동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일본은 생리의학상에 이어 올해 노벨상 2관왕이 됐다. 기타가와 교수는 교토대를 졸업하고, 박사과정도 교토대에서 수료했다. 지금 교토대의 단풍도 여느 관광지 못지않다. 교토의 벚꽃과 단풍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그는 “아무도 하지 않는 기초적인 것, 재미있는 것을 오랫동안 꾸준히 한다는 점이 교토대 전통으로 자리 잡고 그 정신이 이어져 왔다”면서 “앞으로 계획은 하나는 더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품화”라고 말했다.
김자헌 숭실대 교수는 “일본은 100년 가까이 연구자들이 장기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의 주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면서 “한국처럼 단기성과 중심의 제도에서는 이런 연구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1200년을 가꾸어 온 에이칸도 젠린지의 단풍이 이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준다.
그런데 교토에서는 아직도 버스를 타거나 식당에 가거나 단풍명소에 입장할 때 ‘현금만 받는다(CASH ONLY)’고 적혀 있는 곳이 많다. 예약이 불가하니 직접 와서 줄을 서라고 하는 곳도 상당수다. 관광지의 탈 거리이긴 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모는 인력거도 쉽게 볼 수 있다. 순간 “일본은 왜 이리 IT 세상에 늦을까. 전통에 집착해서일까. 아니면 혹시 관료주의 때문일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아날로그 감성을 고집하면서도 노벨과학상을 속속 받아 가는 그들의 생각이 궁금했다. 그래서 일본 공부는 더 해야 하는 모양이다. 이병철 회장 시절의 사장단회의 내용까지 줄줄 외고 있는 어느 일본인 교수를 만난 적이 있다. 한국에 그런 경영학 교수가 있었던가. 국력이란 결국 상대 국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에 달린 것 같다.
한국에 돌아오는 날 어느 신문에 도쿄특파원의 글이 실렸다. “언제부터인지 한국 사회엔 ‘일본을 앞섰다’는 국뽕이 만연해 있다. 노벨상 수상자를 33회 배출했고 건축의 프리츠커상에선 세계 최다 수상자를 낸 나라다. 일본 경제 규모(국내총생산)는 우리보다 2.7배 크고 대외 순자산은 3.5배나 많다. 도쿄 길가엔 쓰레기를 보기 어렵고 지하철에서 통화를 자제하는 시민의식도 정평이 나 있다. 설령 일본이 우리보다 못하더라도, 그게 중요한가. 배울 점이 있다면 찾아야 하고,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익혀야 하지 않을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오늘도 교토에는 적어도 수백 명의 한국인이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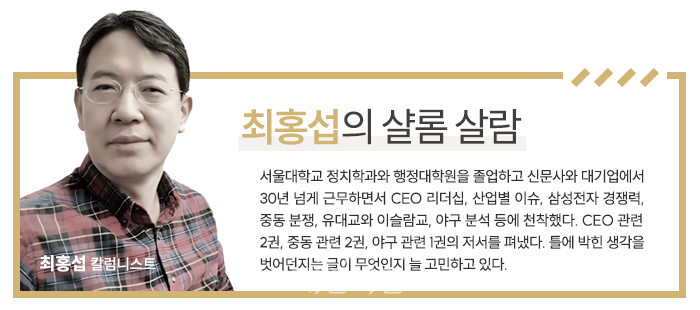 ⓒ
ⓒ
글/ 최홍섭 칼럼니스트
0
0
기사 공유
댓글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실시간 랭킹뉴스
실시간 랭킹뉴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