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이 쏟아내는 ‘틀린 답변’ 비판적 활용하는 ‘AI 리터러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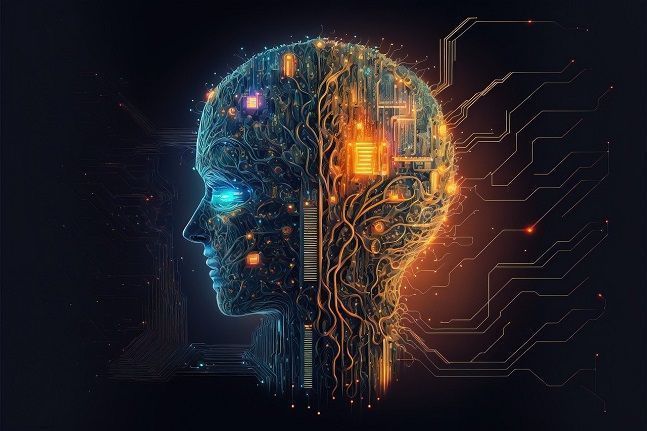 인공지능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인공지능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챗GPT 열풍 속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3’에서도 인공지능(AI)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구현모 KT 대표는 개막 첫날 기자들과 만나 “MWC를 둘러보니 AI는 대세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SK텔레콤 부스를 각각 방문한 최태원 SK 회장과 팀 회트게스 도이치텔레콤 회장은 초거대 AI 모델 ‘에이닷’을 특히 관심 있게 지켜봤다.
에이닷은 SK텔레콤이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한국어 거대 언어모델을 B2C 분야에 상용화한 AI 서비스다. SK텔레콤은 에이닷을 고도화하고 있다. 개막 전날인 지난 26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에이닷은 지식대화 위주인 챗GPT와 달리 감성, 목적 대화를 접목해 차별화를 꾀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성 대화가 적용되면 에이닷이 먼저 대화를 걸거나 경험담을 풀어 놓는 등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목적 대화를 적용하면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앱 이동이나 검색 없이 바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KT는 올해 MWC에서 이번 상반기 출시 예정인 초거대 AI ‘믿음’ 소개 영상을 공개했다. 믿음도 에이닷처럼 감성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까지 갖췄다는 설명이다.
통신사뿐 아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AI 챗봇 전쟁에 참전했다. 네이버는 오는 7월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업그레이드한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서치GPT’를 내놓을 계획이다. 카카오는 2021년 공개한 코GPT에서 한층 발전한 새 버전은 상반기에, AI 챗봇 서비스 ‘코챗GPT’은 올해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이같은 대화형 AI를 비롯한 생성형 AI 시장의 미래는 밝다. 시장조사기관인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지난해 101억 달러(약 13조 원)에서 2030년 1093억 달러(142조 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이 35%에 달한다.
다만 챗GPT는 이면에 문제점도 있다.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는 물론 ‘환각 사례’도 쏟아진다. 전문가들이 ‘헐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이라고 칭하는 환각은 인공지능 챗봇이 존재하지 않는 환각을 보는 것처럼 거짓 답변, 황당한 답변을 내놓는 것을 의미한다.
널리 화제가 된 사례는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이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라고 가공의 사건을 질문하자 챗GPT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한글)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해 담당자에게 분노해 맥북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답변을 내놨다.
제대로 된 질문에도 틀린 답을 내놓기 일쑤다. “신사임당의 남편은 누구였나요?”라는 질문에 “신사임당의 남편은 이순신 장군입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러한 환각은 특정 단어와 연관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단어들을 조합해 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즉 인공지능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운영되기에 ‘필연적으로’ 오류를 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대화형 인공지능을 과신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챗봇의 답변을 늘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AI 시대의 ‘AI 리터러시’다. 대화형 인공지능은 주어진 텍스트를 잘 학습해서 그럴 듯한 답을 내놓은 일종의 도구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