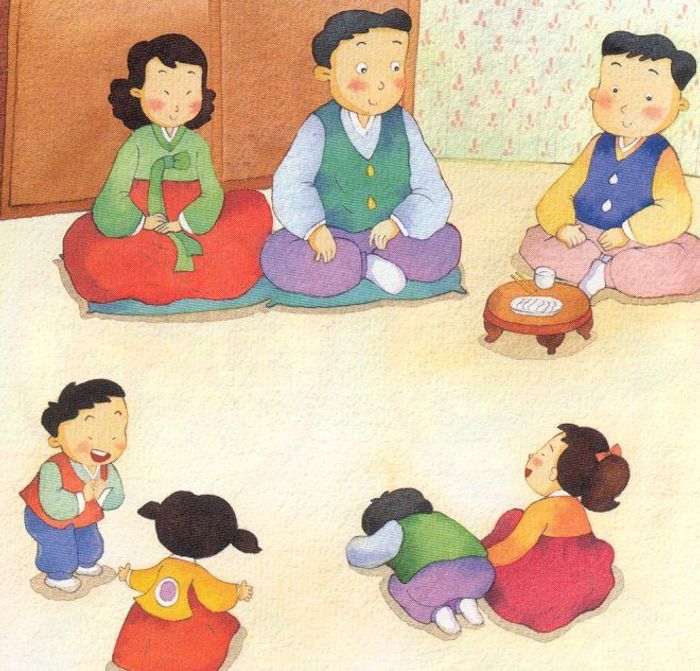 설날 세배하는 모습. ⓒ 데일리안 DB
설날 세배하는 모습. ⓒ 데일리안 DB
설날의 유래는 확실치 않다. 일단 새로운 날이 낯설다는 의미에서, 낯설다의 어근인 ‘설다’가 어원이라는 주장이 있다. 새롭게 개시되는 날을 의미하는 ‘선날’이 설날로 바뀌었다는 설도 있다. 또, 자중하고 근신한다는 의미의 옛말인 ‘섦다’에서 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우리말로 나이를 의미하는 ‘살’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모든 뜻을 반영하면 ‘한 살 나이를 먹는 낯선 날이 새롭게 개시되니 자중하고 근신하며 지내자’는 말이 되겠다.
설 전날을 까치설이라고 하는데 이는 작은 설을 뜻하는 아치설 또는 아찬설이 변한 말이라는 설이 있다. 곳곳에 있는 까치고개, 까치산 등의 지명도 동물 까치가 아닌 작다는 뜻의 아치에서 변형된 것이라고 한다. 아찬은 순우리말로 ‘작다’, ‘이르다’, ‘아직 때가 오지 아니하다’ 등의 뜻이다. 신라시대 때 까마귀 등이 왕을 구했는데 그게 까치를 기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있고, 설날엔 반가운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 전날에 길조인 까치가 운 것으로 여겼다는 설도 있다. 까치의 한자어가 ‘작’인데 어제 ‘작’과 음이 같기 때문에 설의 어저께라는 의미로 까치를 썼다는 주장도 있다. 윤극영 선생의 동요를 통해 널리 퍼졌다고도 한다.
삼국사기 백제, 신라 관련 기록에 설이 등장하기 때문에 삼국시대 또는 그 이전부터 설을 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때는 한식,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이었다고 한다. 설 전날엔 이웃이나 친척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하는 묵은 세배를 하기도 하고 밤부터 새벽 사이에 복조리를 걸어두기도 했다.
조리는 국자처럼 생긴 쌀을 이는 도구인데, 그해의 복을 조리처럼 일어 얻는다는 뜻으로 복조리라 했다. 설 즈음이 되어 복조리 장수에게 복조리를 살 때는 값을 깎지 않았다고 한다. 복조리에 실, 성냥, 엿 등을 담에 문 위나 벽, 부엌 등에 걸어뒀다. 이밖에 설날이 되면 친척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차례도 지내며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등도 즐겼다.
조선말에 서양식 개혁을 해야 한다는 혁신운동이 일어나며 1896년 1월 1일에 고종이 태양력을 도입했다. 그러나 최상층에서 양력 1월 1일을 휴일로 지정하기만 했을 뿐 민간에선 여전히 설을 쇘다. 1907년 순종 즉위년에 총리대신 이완용이 설 행사들을 없애야 한다고 진언했다.
일제는 설을 구정이라 부르며 탄압했다. 설을 쇠는 걸 이중과세라고 했고, 설날에 근무를 강요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기도 했다. 1938년엔 아예 음력 사용을 금지했다. 비록 휴일은 아니지만 설엔 조퇴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것도 금지했다. 설날에 지방민들을 부역에 동원하기도 했다. 떡방앗간의 조업도 금지했고 심지어 설빔을 차려입은 아이들에게 먹물을 뿌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래서 양력 1월 1일은 일제의 것이고 음력설은 우리의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해방 후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서 1월 1일을 신정이라 하며 3일 연휴로 지정했고 심지어 크리스마스까지 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설날은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이승만은 ‘음력설은 우리 민족의 수치’라고 했다고 한다.
4.19 이후 잠시 음력설 탄압이 완화됐지만 5.16 이후 다시 강화됐다. 조국 근대화, 이중과세 등의 명분이다. 1962년엔 ‘구정프로’라는 극장 광고 문구가 금지됐다. 이밖에 구정 임시열차 증편이 금지된 적도 있고 한 지방에선 설 즈음에 떡방앗간을 봉쇄하기도 했다고 한다.
전두환 정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심을 다독이는 유화책을 실시했다. 통금해제 같은 자유화, 운동경기 활성화 등과 함께 1985년엔 음력 1월 1일을 하루 공휴일로 지정했다. 당시 총무처에서 반대했지만 민정당이 여론관리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한다. 민정당이 반응할 정도로 설날을 되찾으려는 국민의 열망이 강력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설날’이라는 이름은 이 당시까진 아직 되찾지 못해서 공식적으론 ‘민속의 날’로 명명됐다.
6월 항쟁 민주화 이후인 1989년에야 설이 공식 명칭이 됐고 3일 연휴로도 지정됐다. 1988년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 84%가 음력설을, 11%가 양력설을 지낸다는 결과가 나왔다. 외환위기 때 이중과세 때문에 양력 1월 1일 연휴가 폐지됐다.
이렇게 보면 주로 국가권력이나 외세가 설을 억압한 반면 국민들이 설을 지켜왔다고 할 수 있겠다. 민주화로 마침내 100여 년 만에 설을 되찾은 것이다. 물론 우리 국가권력이 설을 억압한 데에는 구습을 혁파해서 하루빨리 서구식 근대화를 이루겠다는 명분이 있기는 했다.
어쨌든 100여 년 간이나 억압이 이어졌는데도 국민이 기어이 지켜냈을 정도로 설은 우리 국민과 밀접하게 연결돼있다. 그런 설의 영문 표기를 중국인들이'중국설'(Chinese New Year)'라고 우긴다고 한다.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베트남·필리핀 등 다양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저마다 지내는 명절이기 때문에 특정 나라 이름이 아닌 ‘음력설(Lunar New Year)’라는 중립적인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극력 반발하며 ‘Chinese New Year’라고만 해야 한다고 강변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미국 디즈니랜드에서 미키마우스가 한복을 입고 등장해 설 행사를 치르며 ‘lunar new year’라는 제목을 내보냈는데 중국 누리꾼들이 댓글 폭탄을 날렸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설이 자신들만의 명절이 아님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서구인들 중에선 이런 사정에 대해 잘 모르고 별 생각 없이 ‘Chinese New Year’라고 쓰는 경우가 있다. 유엔이 올 음력설 공식 기념우표에 'Chinese Lunar‘라고 적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구인들도 음력설이 중국만이 아닌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임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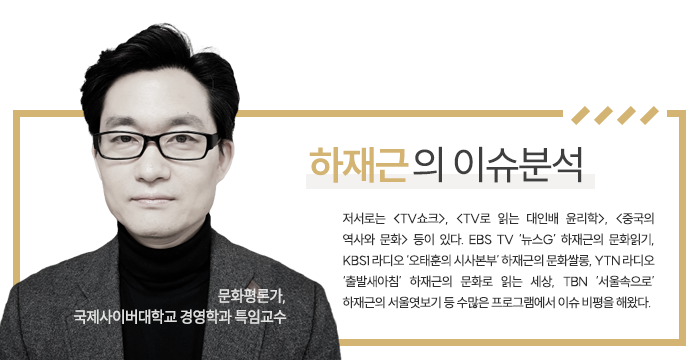 ⓒ
ⓒ
글/ 하재근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