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망명 관여 인사들 "장성택 통해 체제 변화 도모"
김정은의 장성택 처형도 황장엽과 접촉 드러난 탓인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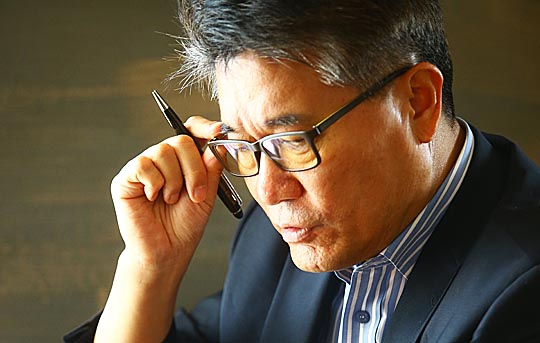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망명과정에서 황 비서 측에 동조했던 북한의 고위 엘리트 인사 중 한 명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였던 장성택 전 행정부장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 비서는 남한 망명 이후에도 비선라인을 통해 장성택 측과 수차례 접촉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도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황 비서와 뜻을 함께 하겠다는 장성택이 김정은 체제의 연착륙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황 비서가 큰 실망을 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황 비서와 김덕홍 씨의 망명에 관여했던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 따르면 이연길 북한민주화촉진협의회 회장(2010년 3월 작고)은 1996년 10월께 장성택·김용순 전 노동당 비서의 대리인을 황 비서의 소개로 만났다. 당시 황 비서 측은 “우리하고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들을 소개했다.
이연길 회장과 김 전 편집장은 1994년께부터 북한의 민주화를 민간차원에서 추진해보자는 ‘북한민주화촉진협의회’를 결성하고 1995년 5월부터 중국의 조선족 등을 통해 김덕홍 등 북한인사를 접촉, 황 비서와의 접촉까지 이끌어냈다.
당시 이들은 △북한 내 민중봉기 유도 △북한 내 쿠데타 유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암살 △황장엽 비서의 망명 등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 황 비서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인사’로 장성택과 김용순을 이연길 회장 측에 소개한 것이다. 장성택 처형 명목이 과거행적 때문인 것으로 엿보이는 대목이다.
황 비서의 망명 이후 김용순 비서는 2003년 6월 의문의 교통사고 이후 병원신세를 지다가 10월 세상을 떠났다. 장성택은 지난 2013년 12월 △국가전복음모 혐의 △불순한 태도 △경제실태와 인민생활의 파탄 초래 등의 죄목으로 처형당한 바 있다.
김 전 편집장은 7일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황 선생이 장성택에게 정부 협조를 받아서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당시 정권에서 ‘장성택이 위험할 수 있다’면서 결사적으로 막았다”면서 “때문에 황 선생이 직접 비밀루트를 통해 장성택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다섯 차례”라고 밝혔다.
"메시지 내용은 장성택이 움직여야 한다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황 선생은 세상을 떠나기 두세 달 전에 저와 만나서 ‘마지막 역할을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시 뵀을 때 ‘황 선생이 오래 사시지 못하겠구나’라고 직감했죠. 황 선생이 장성택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장성택이 움직이지 않고 김정은 체제 연착륙에 총대를 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황 선생의 메시지를 장성택에게 경고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2013년 한 월간지를 통해 장성택이 보유하고 있던 골동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장성택이 우리 측과 함께 했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노출시켰던 것이죠."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데일리안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데일리안
 장성택이 지난 2013년 12월 12일 특별군사재판을 받기위해 국가안전보위부 재판장으로 끌려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장성택이 지난 2013년 12월 12일 특별군사재판을 받기위해 국가안전보위부 재판장으로 끌려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이 장성택 처형부터 올해까지 연이어 벌이고 있는 북한 고위층에 대한 숙청 작업도 장성택의 과거 행적이 탄로나면서 북한 엘리트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13년 5월 김정은이 중국에 보낸 특사가 장성택이 아닌 최룡해 당시 총정치국장이었다는 점에서 장성택 신변에 변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은은 최룡해를 특사로 보내기 앞서 2012년 8월에는 장성택을 보낸 바 있다.
그는 “2013년 핵실험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장성택을 중국에 특사자격으로 보낼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룡해로 특사가 바뀌었다”면서 “이를 보고 장성택에게 변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장성택이 고도의 감시체계에 있었기 때문에 (황 선생과의 약속에 대한) 용기를 못 낸 것인지, 김용순 사망이후 느끼는 바가 많았는지는 모르겠다”면서 “김정일 체제를 황 선생이 만든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 체제가 괴물처럼 변했다는 것에 대해 황 선생이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를 장성택을 통해 해보려고 했는데 장성택이 체제 연착륙에 앞장서면서 실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전 편집장은 황 비서 측과 뜻을 함께 했던 인물로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책임을 뒤집어 쓰고 1997년 ‘반체제 혐의’로 총살된 서관히 당시 노동당 농업담당 비서를 꼽았다. 황 비서가 남한 망명 후 “서관히와는 격 없이 마음을 터놓는 사이”였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김 전 편집장은 “서관히와 황 선생도 연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황 선생이 망명 전, 서관히와 우리 쪽을 연결시키려 했었던 것 같다”면서 “황 선생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 상황도 서관히를 통해 알았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황장엽 비서는 망명 후 자신이 펴낸 회고록을 통해 “1995년에 당원 5만 명을 포함해 50만 명이 굶어죽었고 1996년 11월 중순까지 또 100만 명이 죽었으며 1997년에도 100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편집장은 오는 12일 북한민주화위원회·북한민주화포럼·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황장엽 추모 학술세미나에서 황장엽 망명과 그에 대한 비화들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실시간 랭킹뉴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