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1994' 복고 아닌 현실이기에 아프다
<김헌식의 문화 꼬기>'응답하라 신드롬' 현실의 결핍에서 기인
현재는 과거가 되는 순간 추억이 된다. 지나간 추억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 겪어낸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가눌 수 없고, 미래는 가늠할 수 없다. 다 파악이 되면 선망이 아니라 우습게 보인다. 촌스러움과 우스운 것은 잘 연결된다.
익숙하고 파악되는 것은 촌스럽다. 흘러 보인 정황은 훤히 보이니 촌스럽다. 단 어제 시간이라도 과거이기 때문에 촌스럽다. 그러나 현재가 촌스러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래가 촌스럽다면 삶이 더욱 절망적이다. 과거만이 촌스러워야 흥미롭고 재미있다. 과거는 지금의 지층이다. 마치 농촌 사회가 있었기에 산업 사회가 있고 산업 사회가 있기에 정보사회가 가능했던 것처럼 말이다.
정보사회에 사는 이들에게 농촌은 촌스럽고 산업시대도 촌스럽다. 너무나 흔하고 확연한 것들은 촌스럽다. 잘 모르는, 아니 새로운 것들은 촌스럽지 않다. 아직 익숙하고 질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촌스러움은 정겹다. 우리가 너무 잘알고 흔했고 익숙했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복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들은 익숙하지만 시간의 흐름속에 잊었던 우리의 과거 흔적들이다. 과거는 다이루지못한 것이 있기에 촌스럽고 우습게만 대할 수 없다. 그 결핍은 애닮다. 더구나 너무나 먼 과거는 현재와 분리되어 공감의 요인이 적다.
1980년대는 지금과 너무 멀다. 너무 아날로그 적이라고 해야할까. 한국대중문화가 케이팝 컬처의 본격화를 이룬 1990년대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교차하는 시기다. 대중문화의 실질적인 레전드가 90년대에 증폭된 이유다. 엑스세대 논쟁은 탈정치의 문화 세대의 탄생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적 풍요로움도 1997년 12월 외환위기와 함께 도산해버렸다. '응답하라 1997'은 외환위기 직전의 젊은이들의 사랑을 회고적으로 오간다. '응답하라 1994'는 문민정부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그 시간대에 고정되어 버렸다. 언제나 지나고 나면 그 때는 풍요로운 시기였다.
그들은 취직과 고용, 학점의 스트레스를 적당히 받고 있었고, 그 고통은 외환위기 이후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다,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야 그렇듯이. 하지만 모두 현재에 힘들다. 지금 현재도 그렇듯이. 사랑도 그렇다. 지나고나면 보인다. 다른 드라마들과 매우 차별화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응답하라 시리즈는 복고 문화사가 과거형 사랑타령인 것이다. 화제과 되는 복고적 사물과 장치는 모두 눈요깃거리였다.
첫사랑에 얽힌 이야기는 언제나 보편적인 소재에 머물 수 있다. 비록 1994년 즈음의 첫사랑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1994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활성화 되기전 그들의 '첫사랑'은 아날로그 차원의 감수성을 간직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나 사회에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그들의 감정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엑스 세대이다.
물론 과거로 돌아가 대학생들의 첫사랑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은 다른 드라마들이 비슷한 포맷으로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는 탓이라 보여진다. 최고의 드라마로 열광하는 상황은 낯설다.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이나 '여자 셋 남자 셋'과 같은 드라마는 현재는 없고 과거 속에만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 실체를 알 수 있다. 1994년에 없었던 사랑을 다시 2013년에 꺼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1994년에도 2013년에도 없는 사랑을 담아내고 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캐릭터나 그들의 행동은 모두 실제 남자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세상에 없는 이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응답하라 1997'이나 '1994'는 과거를 되살리는 듯 싶지만 판타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시공간을 연출하기 때문에 마치 현실에 있었던 것처럼 인식될 뿐이다. 영상속 복고는 사실이 아니라 허구이며 미래인 것이다. 정말 그들은 미래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
복고는 레트로 장르로 굳어졌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세대는 나이 들어가고 사회 중추세력으로 성장하는가 싶더니 쇠퇴하고 다시 새로운 시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응답하라 1994, 1997'이 화제를 모으는 것은 그 시기를 너무나 확연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사회중추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가요무대'나 '70-80'코드는 다른 양식이지만 과거를 소비하는 방식은 미디어적이다.
'응답하라'에 열광하거나 그 시기를 더욱 추억하는 상황은 현실의 결핍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더이상 너무 많이 알아버린 자신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과거의 촌스러움으로 빠져든다. 그 세계는 얼마든지 통제가능할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 돌아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만 싶다. 하지만 붙잡을 수 없기에 더 애린다. 마치 지금이라면 다시 잡을 수 있을 듯한 몽환속에 거닐게 한다.
이 순간 다시 현재는 과거가 되었다. 곧 2000년대를 향해 응답하라를 외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현재화 되지 않으면 판타지에서 맴돌 뿐이다. 과거의 사랑도 과거의 인물도 마찬가지다. 최근 '노란 샤쓰 입은 사나이'로 한류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던 가수 한명숙이 신곡을 들고 현역 가수임을 알렸다. 한명숙 만이 아니라 몇몇 원로 가수들이 귀환했다. 그들은 언제나 과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여전히 존재할 때 살아있으며 다시 추억하게 한다. 과거를 불러낼 때 현재만이 응답한다. 현재의 사랑으로 응답되어야 한다.
글/김헌식 문화평론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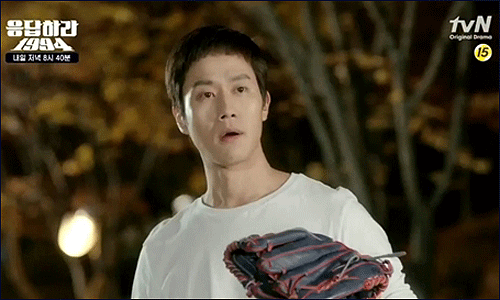 tvn '응답하라 1994' 동영상 화면 캡처.
tvn '응답하라 1994' 동영상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