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후행동이 위기다.
ESG가 기업 경영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른 요즘, 이에 대한 비판과 거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과 ‘녹색산업’이 ESG를 이끄는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그러나 팬데믹의 종료와 함께 찾아온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슈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여러 기업이 ESG 투자가 기존 투자 전략과 대비해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ESG 종언’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기후 변화로 탄소 절감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ESG가 이끄는 가치들이 퇴색된 지금, ‘안티 ESG’는 점점 퍼지고 있다.
 Freepik
Freepik
현재 미국은 ESG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된 지 오래다. 2021년과 2022년 동안 미국의 18개 주가 ESG 투자를 규제하거나 관련 투자 방침을 채택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것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 미국 기업은 ESG가 정치색에 물드는 지금, 이 상황이 그저 난처하기만 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거나 투자설명서에 ESG 관련 내용이 기재된 펀드는 증권신고서에 투자 목표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지만 이를 죄악주 취급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고비용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반면, 원전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
잠깐 어려운 정치경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후행동이 정치색과 자본의 순환 원리에 물들어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것이다. 화석연료의 사용과 플라스틱 배출을 줄여나가며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친환경을 생각하는 그 의도와 선한 영향력은 개인을 넘어 더욱 큰 영향력으로 집결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곧 기업과 지자체, 국가이다.
인권과 환경을 고려하는 경영과 투자는 미래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것이 전쟁 등의 세계 이슈로 에너지 위기가 찾아와 정치와 자본의 원리를 생각하다 보니, 앞서 언급한 키워드의 본질이 흐려진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ESG와 탄소중립에 대하여 한국과 기업 역시 그 본질과 앞으로의 전략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들은 업계 전문가의 의견이 없이 정치적 이유에 의해 설정된 것이 대부분으로, 대부분 해외 정책을 뒤따르기만 한 느낌이 적지 않다. 태양광 확산 정책,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등의 문제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전력시장은 최저 수요를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은 이러한 친환경 정책 및 ESG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Freepik
Freepik
많은 전문가가 지금의 지구는 '온난화 시대'가 아닌 '들끓는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기후 위험이 많은 경제 주체들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어 경제 침체 및 시스템 붕괴의 요인이 될 것이라 우려한다.
그렇기에 '지속 가능성',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경영 트렌드인 ESG는 유지될 가능성 역시 있다. 기후행동은 정치색에 물들면 안 된다. '그린워싱', '가짜 친환경'과 같은 기업의 기후 역행동에 따른 자본의 추구 역시 지양하고 더욱 회의적인 시선으로 주목하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지구가 이 이상 끓어 넘치지 않을 방법, 그리고 우리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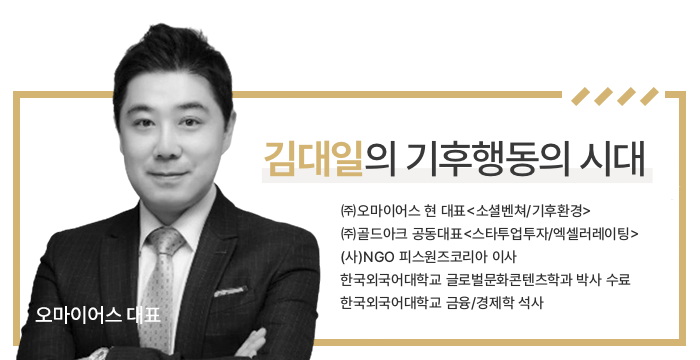 ⓒ
ⓒ
김대일 오마이어스 대표xopowo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