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나쁘다고? 얼마나 좋은지 가르쳐줄게!
<자유경제스쿨>80년대 영국 고질병 정면 타개 공기업 민영화 성공
주인 없고 정치적 입김 들어오므로 공기업들은 과잉 고용 상태
철도 산업의 민영화를 지레 겁내는 철도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각한 주제들을 성찰하게 만든다. 특히,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대한 지식인들의 지나친 너그러움과 공권력의 허약함이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풍토는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그래도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 정권이 민영화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다.
정부의 개혁안이 민영화라고 주장하면서 시작한 불법 파업에 대해 ‘불법’을 문제 삼지 않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설득하려고 나섬으로써, ‘신이 부러워하는 직장’들인 공기업들의 근본적 개혁을 엉겁결에 포기한 셈이다. 이제 민영화가 합리적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은 훨씬 힘들어졌다. 그래도 그 일을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민영화의 근거를 다시 천명하는 일이 긴요하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밝혔다. 아직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만, 그것을 실행하려면, 우리 경제를 좀더 시장 경제의 이상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즉 자유화가, 긴요함은 분명하다. 경제를 쉽게 자유화하는 길들 가운데 하나는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는 것이다. 현재 민영화의 대상이 될 만한 공기업들이 많으므로, 그 효과도 상당히 클 것이다.
공기업들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영이었던 명령 경제 체제의 실상은 잘 알려졌다. 경이적 발전을 이룬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공기업들의 부패와 낮은 생산성이라는 사실도 있다. 따라서 공기업들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런 까닭들은 대체로 잘 알려졌다.
공기업들은 관료주의적이고, 기업의 결정이 흔히 정치적 영향 아래 놓이고, 주인이 없는 셈이므로 노동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낮고 으레 과잉 고용이 나오며,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정부는 대체로 민간 기업들보다 투자를 소홀히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기업을 소유하느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주류 경제학의 정설이었다. 중요한 것들은 경영의 존재,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보수, 적절한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과 같은 것들로 여겨졌다. 근년에 그런 생각이 바뀌었다.
물론 그런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누가 소유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경쟁의 양상이나 정부의 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더라도, 공기업을 민간 기업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 과정은 아주 단순하고 깔끔하니, 공기업을 주식회사로 바꾸어 그 주식들을 시민들에게 적절한 기준에 따라 나눠주면 된다. 국영 기업의 민영화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종업원들의 거센 반대다. 그러나 민영화는 궁극적으로 종업원들에게도 유리하므로, 충분한 설명이 따르면, 종업원들의 반대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민영화는 많은 나라들에서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명령경제 체제를 헐고 시장경제 체제를 세운 나라들은 대체로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게다가 우리는 그렇게 먼저 민영화를 추진한 사회들의 경험들에서 소중한 교훈들을 배워서 민영화를 훨씬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질 나라는, 널리 인식된 것처럼, 영국이다. 영국은 1980년대에 대처 정권 아래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민영화를 아주 과감하게 시도하여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민간 부문으로 넘겨진 기업들이 다양하고 그런 민영화의 결과에 대한 분석과 처방이 잘 되었다는 점에서 영국의 경험은 우리가 자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교훈들 가운데 중심적인 것은 경쟁의 중요성이다. 경쟁이 시장 경제의 본질적 특성인 만큼 당연한 얘기지만, 그것은 흔히 잊혀진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자연적 독점이므로, 경쟁이 나오도록 하나의 공기업을 여럿으로 나누는 것이 긴요하다. 민영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렇게 경쟁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민영화의 효과는 작을 수밖에 없다.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어렵게 한 조치들을 푸는 일(deregulation)을 통해 새로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도 긴요하다. 민영화의 과정에서 필요 없는 인원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인이 없고 정치적 입김이 많이 들어오므로, 공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과잉 고용 상태다.
민영화로 생긴 자금을 쓰는 일은 아마도 성공적 민영화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공기업을 팔아서 얻은 돈은 국채를 발행해서 얻은 돈과 같다. 정부의 수입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돈을 경상적 사업이나 조세 감면의 재원으로 쓰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 재산의 형태만을 바람직하게 바꾼다는 뜻에서,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민영화와 관련하여 음미할 만한 사실은 민영화에 가장 성공을 거둔 대처 정권이 원래부터 민영화에 중요성을 부여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1979년 선거에서 보수당이 내건 공약에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 1983년의 선거에서도 중심적 논쟁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민영화 작업이 시작된 것은 1984년이었다.
그것이 중요성을 지니게 된 것은 공공 지출의 몫을 줄인다는 보다 근본적 논점에 대한 이념적 대체물이 된 뒤부터였다. 공공 지출을 줄이기는 무척 어려웠지만, 공공 재산을 파는 것은 아주 쉬웠기 때문이다. 민영화는 알차면서도 이행하기 쉬운 정책이다.
글/복거일 소설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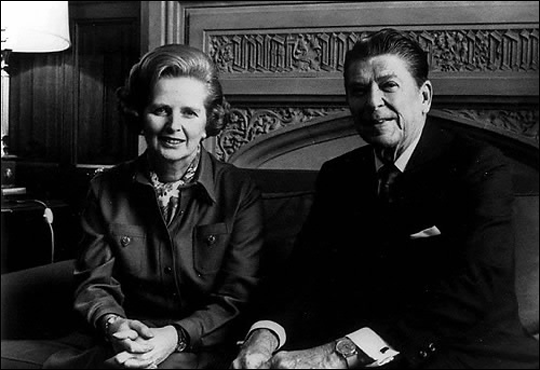 대처 전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DB
대처 전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