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이찬(伊飡) 칠숙(柒宿)과 아찬(阿飡) 석품(石品)이 반란을 꾀하였다. 왕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칠숙을 붙잡아 동시(東市)에서 목을 베고, 9족(九族)을 모두 죽였다.
서기 631년,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평왕 53년에 나오는 기록이다. 이찬이라는 관등은 신라의 17관등 중 두 번째로 높은 관등으로 진골이라는 왕족을 비롯한 유력한 귀족 집단만이 임명될 수 있다. 아찬은 17관등 중 여섯 번째로 높은 관등으로 진골과 6두품이라는 귀족 집단이 오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칠숙은 지금으로 치면 부총리나 장관급, 석품은 서기관이나 이사관 정도 되는 고위 관료인 셈이다.
 선덕여왕릉 (필자 촬영)
선덕여왕릉 (필자 촬영)
삼국사기에는 두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다. 다만 반란을 꾸미다가 들켰고, 당사자와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했다는 내용만 나와 있다. 반란자들이 처형된 장소는 지증마립간 때 만든 동시인데 서라벌의 동쪽에 있는 시장이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반란자와 친인척들을 공개 처형해서 본보기로 보인 셈이다. 석품은 탈출에 성공해서 백제로 도망치다가 나무꾼과 옷을 바꿔입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보고 붙잡혀서 처형당했다. 아마, 먼저 죽은 칠숙과 같은 장소에서 죽었을 것이다. 친인척들을 모두 죽였는데 석품의 가족을 살려둔 이유는 역시 그를 붙잡기 위한 인질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칠숙과 석품은 왜 반란을 일으켰고, 무슨 이유로 실패했을까? 관련 기록들은 없지만 당시 신라의 상황은 어느 정도의 단서를 제공한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신라의 신분제인 골품제를 배웠다. 성골과 진골, 그리고 육두품으로 나눠지는데 성골은 왕족과 왕실의 혈통과 연결된 유력 귀족, 진골은 귀족, 육두품 중 6에서 4두품까지는 일반적인 귀족으로 분류되며, 그 아래 등급은 일반 평민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골품제는 약간 농담을 섞어서 말하자면 ‘뼈의 등급’ 정도 될 것이다.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성골은 ‘성스러운 뼈’ 그리고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는 진골은 ‘진짜 뼈’ 정도 된다. 이찬까지 오른 칠숙은 진골, 아찬의 석품은 진골 혹은 육두품이었을 것으로 모두 신라의 지배계층에 속한다. 그런 인물들이 실패한 확률이 높았던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당시 신라의 임금인 진평왕의 후계 구도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3년이라는 재위 기간에서 알 수 있듯 진평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오랜 기간 통치를 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후계자로 삼을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보통 왕조 국가에서는 이런 경우 남자 후계자를 방계에서 골라서 즉위시켰다. 조선시대에 양반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조카를 양자로 들여서 집안을 계승시키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진평왕은 그런 방식 대신 딸인 덕만공주를 후계자로 삼겠다고 공표한다. 전무후무한 여왕의 탄생을 눈앞에 둔 신라 조정은 혼란에 휩싸였을 것이다. 일단 백제와 고구려와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이었다. 진평왕의 재위 기간에도 백제와 고구려가 여러 차례 쳐들어왔다. 특히, 진평왕의 재위 후반부가 되면 백제의 공격이 거세져서 여러 개의 성이 함락당하고 장수들이 전사하는 일들이 빈번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싸울 수 없는 여왕의 등극이라는 상황은 많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불만으로 옮겨가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거기다 은근히 자신이나 자신의 집안으로 왕위 계승권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물론, 진평왕은 성골에게만 왕위가 이어진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그것으로 모든 불만을 잠재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진골로 추정되는 칠숙은 자신 혹은 자신의 집안에게 돌아올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한 왕위 계승권이 멀어지자, 반란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석품은 아마 칠숙의 최측근 정도로 추정된다. 아마 김춘추와 김유신의 관계 정도로 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반란은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기록을 살펴보면 칠숙과 석품이 거병을 해서 진평왕 세력과 충돌을 했다는 뉘앙스는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반란을 모의한 단계에서 들켰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반란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을까? 그것은 진평왕의 의도로 보인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는 자신이 죽고 딸이 여왕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생길지 모를 혼란을 크게 걱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건 본보기를 보여줘서 불만 세력들을 잠재우는 것이다. 그래서 반란의 처리 과정에서 9족을 모두 처형한 것도 일종의 경고였던 셈이다.
어쩌면 진평왕이 펼쳐놓은 함정에 칠숙이 걸려들었다는 상상도 가능하다. 어쨌든 칠숙이 반란을 일으켜서 진평왕과 덕만공주를 죽이려고 계획했다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칠숙이 동원했거나 동원하려고 했던 군대는 서라벌에 주둔한 중앙 군단인 6정 중 일부 혹은 왕궁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몇 년 전에 창설된 시위대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반세기 넘게 통치한 진평왕은 그런 움직임을 미리 눈치챘고, 반란은 초기 단계에서 진압되었다. 그리고 뒤따른 것은 가혹한 처벌이었다. 진평왕은 칠숙과 석품의 반란을 진압한 다음 해인 632년 정월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그의 의도대로 덕만공주가 왕위에 오른다.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선덕여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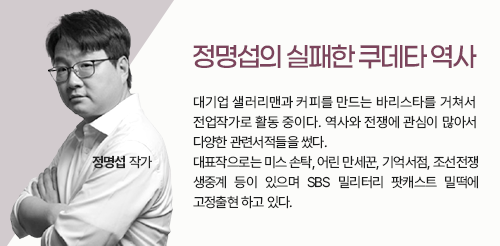 ⓒ
ⓒ
정명섭 작가